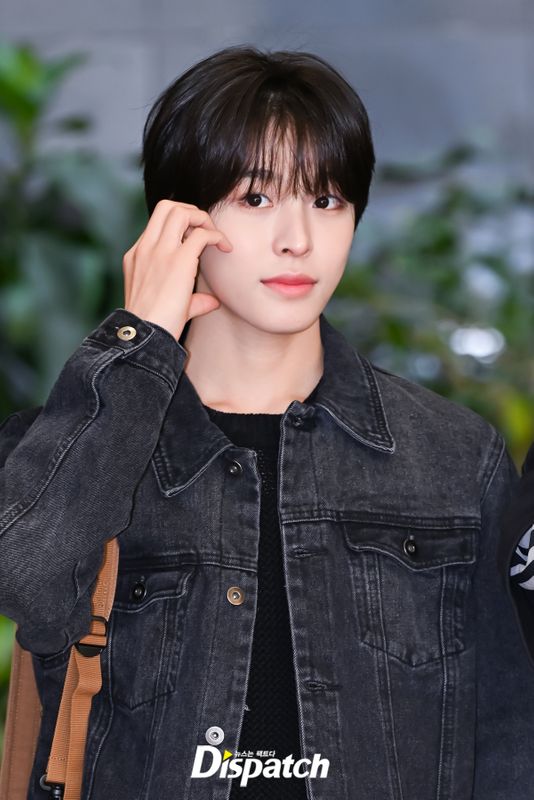[Dispatch=박수연기자] 제임스 건 감독은 기존 '슈퍼맨'과는 다른 노선을 선택했다. DC 히어로물 특유의 다크함을 걷어냈다. 만화적인 색감과 유쾌한 톤으로 채웠다.
그의 대표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밝은톤을 가져왔다. 유머와 감성을 조화롭게 버무리며 캐릭터의 내면을 깊게 조명했다. 압도적인 힘보다 인간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
그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인간적인 우주 이야기를 꺼냈다면, 이번엔 인간적인 히어로물이다. 색다른 슈퍼맨의 탄생으로 DC 유니버스 리부트를 알렸다.
다만, 그 과정에서 DC 히어로물의 색은 완전히 사라졌다. 무거운 톤과 철학적인 주제 대신, 제임스 건 감독의 색깔만 짙어졌다. '가오갤' 혹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옷을 입은 '슈퍼맨' 느낌.
마블을 떠난 제임스 건 감독이 DC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지는 엿볼 수 있었다.
(※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 흔들린 상징
제임스 건 감독은 리처드 도너 '슈퍼맨'(1978)의 향수를 영화 곳곳에 담았다. 데일리 플래닛, 홀 오브 저스티스, 존 윌리엄스의 클래식 테마곡을 등장시켰다.
로이스 레인(레이첼 브로스나한 분)은 외모부터 말투, 성격, 직업 윤리까지 1978년 마고 키더를 그대로 재현했다. 이전 슈퍼맨 리부트들은 방향이 분명했다.
'슈퍼맨 리턴즈'(2006)의 브랜든 루스는 크리스토퍼 리브의 정서와 외형을 제대로 구현했다. 고전 시리즈의 감성을 그대로 계승했다.
'맨 오브 스틸'(2013)은 완전히 달랐다. 잭 스나이더는 슈퍼맨의 내면적 고뇌를 강조했다. 고독하고 내면에 균열이 있는, 새로운 슈퍼맨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제임스 건의 '슈퍼맨'은 애매했다. 고전 서사를 따르긴 했지만, 오리지널을 넘어 설 만한 임팩트는 부족했다. 잭 스나이더가 보여준 신선함이나 의외성도 없었다.
스몰빌 방문 장면이나 부모와의 기억은 감정의 밀도가 부족했다. 로이스 레인(레이첼 브로스나한 분)과의 로맨스는 존재만 할 뿐, 서사는 없었다. 결국 영웅성과 인간미,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담지 못했다.

◆ 희망의 균열
슈퍼맨은 평소 '클락 켄트'라는 이름으로 정체성을 숨긴 채, '데일리 플래닛'의 평범한 기자로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순식간에 영웅으로 변신한다.
그는 여전히 거대한 위협에 맞서 싸운다. '존재 자체가 희망'인 히어로라는 설정도 그대로였다. 괴수와의 격돌 중에도, 작은 생명부터 구해낸다.
최대 악역은 렉스 루터(니콜라스 홀트 분)다. 그는 슈퍼맨의 전투 패턴과 행동 방식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강력한 빌런들과 손잡고, 그를 '주머니 우주'에 가둘 약점까지 손에 넣는다.
렉스 루터는 여론전까지 펼쳤다. 슈퍼맨 부모님의 "인류를 지배하라"는 영상 편지를 손에 넣었다. '슈퍼맨이 인류를 대학살하려는 목적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루머를 퍼트렸다.
슈퍼맨은 그 영상 단 하나로 맥없이 무너졌다. 슈퍼맨을 지지하던 시민이 단숨에 등을 돌렸고, '구속'을 외쳤다. 순식간에 180도 바뀌는 민심은 설득력이 부족했다.

◆ 볼거리가 많아도, 너무 많다
기존 슈퍼맨은 무적이었다. 압도적인 힘으로 주로 혼자서 빌런들을 해치워왔다. 제임스 건은 슈퍼맨의 힘 크기를 조절했다. 강한 슈퍼맨이 아닌, 고민하는 슈퍼맨으로 그렸다.
"모두를 구할 수 있다"가 아닌, "과연 구하는 것이 옳은가"를 고뇌한다. 그 과정에서 서사가 쌓이며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슈퍼맨의 본질은 점점 흐려졌다.
갈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줏대 없는 슈퍼맨만 남았다. 슈퍼맨은 렉스 루터가 짜놓은 함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기지를 침략당하고, 뻔한 교란 작전에도 쉽게 휘말린다.
저스티스 갱, 메타모르포 등 다양한 히어로를 등장시켰지만, 활용도는 아쉬웠다. 지미 올슨, 이브 테스마커는 거의 장식 수준이었다.
영화 초반에 등장한 가이 가드너, 호크걸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분량이 아예 실종됐고, 결말 보라비아와 자한푸르크의 전쟁에서 다시 나타났다.
최종 결투 역시 허무했다. 슈퍼맨을 복제한 '울트라맨'과의 대결은 잠시 팽팽하게 이어진다. 하지만 슈퍼독 크립토가 카메라를 부수면서 조종이 차단되고, 전투는 허망하게 끝난다.
다만, 액션에 공을 들인 것은 분명했다. 슈퍼맨과 엔지니어(안젤라 스피카 분)와의 공중 전투 장면에서는 CG 연출의 정점을 찍는다. 액션은 화려했고, 속도감도 넘쳤다.

◆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제임스 건의 노력은 확실히 보였다. 수차례 리부트된 프랜차이즈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조립했다. 특유의 위트 넘치는 대사로 웃음을 유발했고, "영웅은 어디에나 있다"는 메시지로 휴머니즘을 더했다.
새 슈퍼맨 데이비드 코런스웻도 인상적이었다. 완벽하지 않은 히어로의 얼굴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추락해도 다시 날아오르는 모습은, 강하면서도 인간적인 히어로 그 자체였다.
슈퍼맨, 빌런, 다양한 조력자들의 전투 등 볼거리는 풍부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 한 탓일까. 전개는 산만해졌고, 이야기의 밀도는 떨어졌다.
제임스 건은 DC 리부트의 첫 주자로, 과감히 '1세대 영웅' 슈퍼맨을 꺼내 들었다. 기존의 무거운 틀을 과감히 걷어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슈퍼맨은 완성형이 아니다. 제임스 건이 그려갈 DC 세계관의 서막이다. 그가 다음 작품에서 어떤 퍼즐을 맞춰 나갈지, 기대해볼 만하다.
<사진제공=워너브러더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