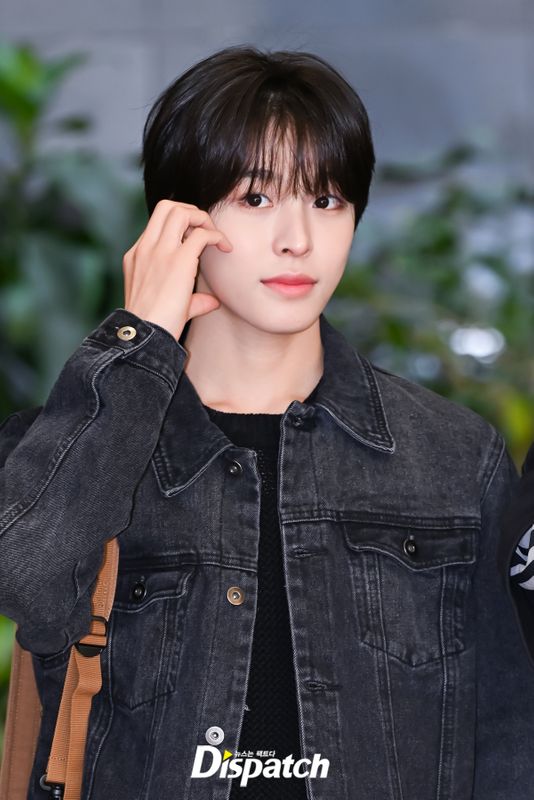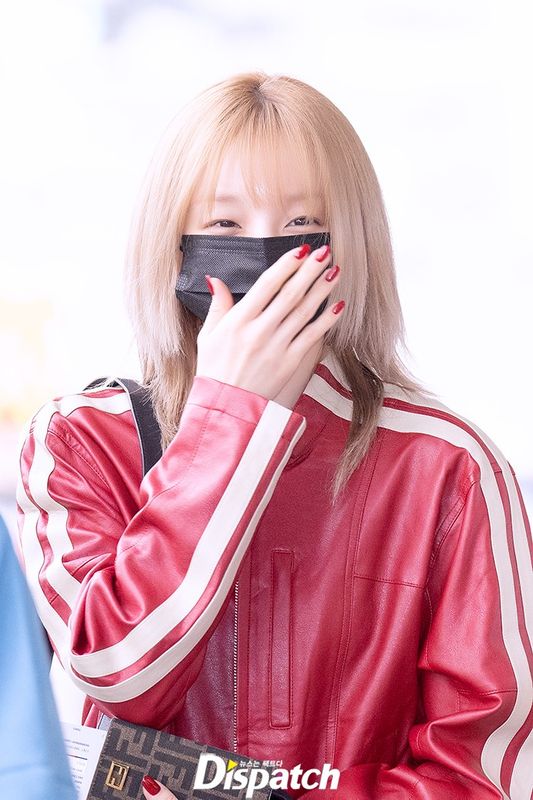[Dispatch=김다은기자] 어느 겨울밤. 열아홉 살 소년이 친구의 집을 찾았다. 친구의 집은 용산. 건너편에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 있었다.
소년이 친구집 옥상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때. 귀를 찢을 듯한 총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무려 20분 동안이나. 소년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1979년 12월 12일. 바로,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날이었다.
"그 총성은 대체 뭐였을까?"
소년은 총성의 이유를 궁금해했다. 그날 밤, 공관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소년이 총성의 진실을 알게 된 건,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다.
그날로부터 4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소년은 올해로 62세가 됐다. 그의 이름은 김성수. 영화 '서울의 봄'을 연출한 베테랑 감독이다.
"제 인생의 숙제를 풀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은 한국 근현대사의 핵심적인 사건이죠. 하지만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꼭 생생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디스패치'가 김성수 감독과 최근 인터뷰를 진행했다. 영화 '서울의 봄'의 개화 과정을 들여다봤다.

◆ '서울의 봄'은, 내 인생의 숙제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하는 영화다. 전두광(황정민 분) 주축의 신군부 세력이 서울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반란군과 진압군의 9시간 공방전을 담는다.
김 감독은 지난 2019년, 제작사 대표로부터 시나리오를 받았다. 처음엔 거절했다. 싫어서가 아니다. "내가 감히 이 대본의 열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것.
"정말 소망해 왔던 소재였습니다. 시나리오까지 좋았죠. 순간, '앗 뜨거'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단 거절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김성수 감독은 실제로 '서울의 봄'을 경험했다. 김성수 감독은 19살에 한남동에 살았다. 12월 12일 밤 총성을 직접 들었다. 성인이 되어서야 총성의 정체를 알게 됐다.
그 겨울밤은, 그의 기억 속에 끊임없이 재생됐다. 김 감독은 결국 이듬해인 2020년, 메가폰을 잡았다. 한국 근현대사의 핵심 사건을 그려보자고 용기를 냈다.
"12월 12일 밤은 아주 핵심적인 날입니다. (전두환이) 청와대에 입성한 9월 1일까지, 264일의 쿠데타를 압축하는 날이라 볼 수 있죠. 극 중 전두광과 노태권은 그날 밤을 거치며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악당으로 탄생합니다."
김 감독은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서울의 봄'을 완성했다. 반란군 세력에 끝까지 맞서는 진짜 군인 '이태신'을 새롭게 그렸다. 완강한 인물을 중심에 두고, 신군부 세력이 저지른 만행을 보여주고자 했다.
◆ "전두광, 황정민이 해답이었다"
그런데 각색 과정에서 고민이 깊어졌다. 너무 매력적인 악당이 탄생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관객이 결코 악인의 감정에 몰입하는 경우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두광 배역에 주의를 기울였다. 전두광은 전두환을 모티브로 삼은 상징적 캐릭터. "전두광에게 일말의 동정도 가지 않았으면 했다. 아주 교활하게 보였으면 했다"고 답했다.
"전두광은 인간적으론 유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룻밤 동안, 자신의 영달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욕망까지 자극해 모두가 그의 욕망 열차에 타게 하죠."
김 감독이 찾은 해답은, 황정민이었다. 둘은 영화 '아수라'(2016년)에서 이미 호흡을 맞춘 사이. "황정민은 0.1초 만에 자기 배역으로 달려가는 배우다. 전두광의 적임자는 황정민뿐이었다"고 밝혔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황정민은 전두광을 집어삼켰다. 우선, 전두환의 트레이드 마크인 탈모 헤어. 분장만 매번 4시간이 걸렸다. 김 감독의 "살살 하라"는 주문에도 요지부동.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김 감독은 "엔딩 신에선 황정민이 오랫동안 톱배우인 이유를 알겠더라"며 "철모를 쓰는 장면이라 가발이 필요 없었다. 한데 황정민이 '이건 진짜 전두광이 아니다. 불편하다'며 분장을 다시 해왔다"고 감탄했다.
"전두광의 폭주 장면이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황정민이 리허설을 하고 오는데, 와! 진짜 사람을 해칠 것만 같았어요. 연기인 걸 아는데도 바보같이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 어떤 배우에게서도 느낀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 "이태신의 신념, 정우성에게 있었다"
김 감독의 말대로, 황정민은 온몸으로 캐릭터를 소화했다. 하지만 그의 치열함이 빛난 건, 그만의 노력이 아니었다. 배우 정우성이 버티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황정민이 맡은 전두광은 군 조직 전체를 주름잡는 불같은 캐릭터. 그에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태신이다. 태신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전두광에 비례하는 무게감이 필요했다.
김 감독은 "전두광이 활화산 같은 사람이라면, 이태신은 깊은 호수같이 고요했으면 했다"며 "원래는 이태신이 전두광보다 더 불같은 사람이었다. 불과 불의 대결은 재미없을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결국 감독의 머릿속, 이태신의 옷을 입을 만한 배우는 정우성뿐이었다. "이태신이 지조 있는 선비처럼, 점잖게 자기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인물이길 바랐다. 정우성에게 그런 신념을 봤다"고 했다.
김 감독과 정우성은 각별한 사이다. '비트', '태양은 없다', '아수라' 등 여러 작품을 함께 했다. 그럼에도 정우성은 새로웠다. "수십 년을 본 정우성인데, 새 감정을 느꼈다"고 찬사를 보냈다.
"정우성이 철조망과 바리케이드가 쳐진 세종로 거리를 넘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찍은 신이죠. 그가 길의 끝, 황정민 앞에 서는 장면이 아직 생생합니다. '참 멋있게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김 감독은 마지막으로 바리케이드 신의 의미를 강조했다. "전두광의 '창피한 승리'로 결국 막을 내린다. 이 서사의 엔딩을 다시 되새겼으면 한다"며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봤으면 한다"고 바랐다.

<사진제공=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